당나귀 ‘이오’한테 배운다
입력 : 2023.10.26 20:39 수정 : 2023.10.26. 20:40 이갑수 궁리출판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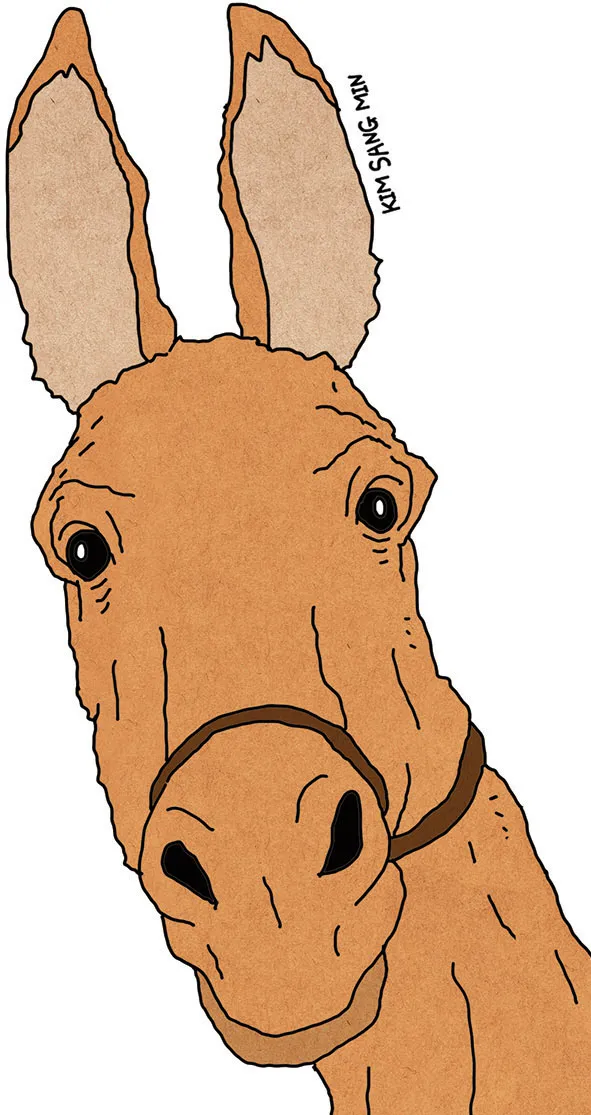
늦은 밤 지하철이 시끌벅적해졌다. 먼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
신나게 떠드는 것을 보며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람의 언어란 무엇인가. 소리가 말이 되는 건 직립하고 관계가 있다고 한다.
직립이란 몸통에서 나온 가지를 발과 손으로 인수분해한 것.
네 발 중 두 개를 떼내어 손으로 재분류한 것.
그 덕분에 하늘을 발견하였고 내 것을 챙긴다는 소유개념도 생겨났다.
그리고 목구멍에 변화가 일어나 소리를 정교한 말로 만드는 것.
영화 <당나귀 EO>의 주인공 ‘이오’는 겨우 당나귀이다.
딸랑딸랑 폐철 싣고 왔다가 고물상의 사나운 경비견한테도 주눅이 든다. 제 이름 적듯 앞발로 흙이나 긁을 뿐이다. 영화는 사람의 시선, 환상, 당나귀의 시선이 교묘하게 뒤섞인다. 곡마단에서 우정을 나눈 소녀와의 이별과 재회를 다루었다면 영화는 그야말로 신파로 흘렀을 것이다.
영화는 당나귀를 홀로 존재하는 단독자로 대접한다.
당나귀의 눈에 비친 각종 찌질한 인간 군상들. 종류가 가지가지지만 하나만 적는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좋아하는 근엄한 인물.
떠돌던 이오는 세상의 마지막에 도착한다.
농장에서 닭장 치우다 무슨 구경난 줄 알고 늘어난 멜빵바지 입고 뛰어가는 마음씨 넉넉한 농부인 줄 알았다. 화면이 확대되면서 줄이 선명해진다. 국제공항에서 리을자로 늘어선 대기줄처럼 그것은 도살장으로 가는 소의 행렬이다. 향도처럼 천천히 걸어가던 이오도 이윽고 소들하고 섞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쿵, 그 무엇이 그 어디로 떨어지는 듯 음악이 한바탕 구르고, 나는 한 편의 시를 찾았다.
“(…) 고속도로 위에 새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새의 살을 들고 가서 누구도 삶지 않았다/ 우연히 죽은 새는 아무도 먹지 않네/ 살해당한 새만 먹을 수 있네”
(‘우연한 나의’, 허수경)
이오, 이오, 이오…. 모음만으로 소리치는 당나귀.
제가 감당해야 할 바를 파악한 듯한 이오의 시선에 내 그것을 의탁하여 어둠 속 출판도시와 심학산의 문명을 응시해 본다.
입술과 이와 혀, 입천장과 목구멍.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이오는 왜 말을 안 만들까.
그것은 왜 동물은 직립하지 않을까와 똑같은 질문이다.
그러니 그것은 또 이렇게 이어진다.
왜 그들은 아직도 네 발로 이 대지를 공손히 붙들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