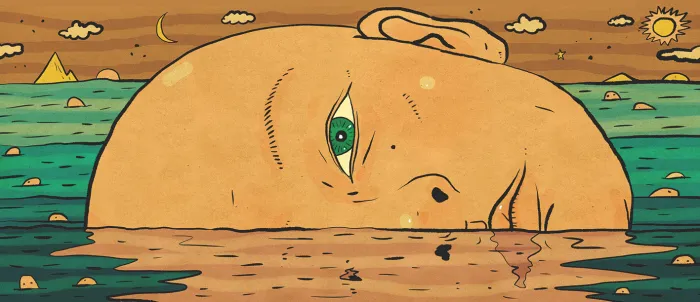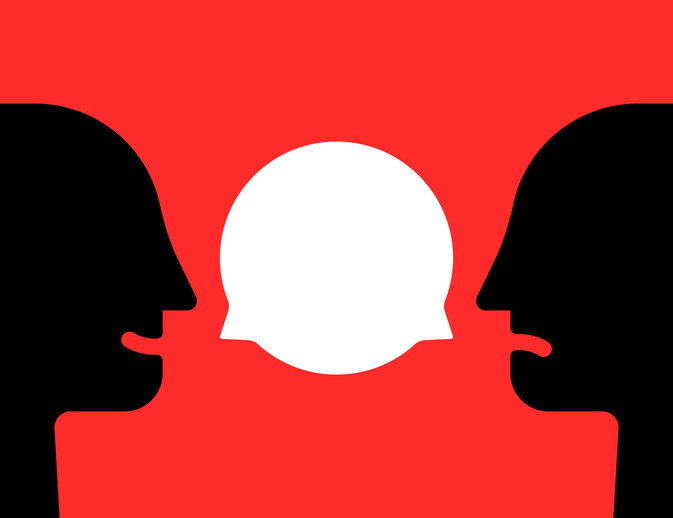한소끔 [말글살이]수정 2025-03-07 07:26 등록 2025-03-06 14:30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 못했다. 가난뱅이 손에 쥐어진 식재료가 마르고 앙상한 것밖에 없어서였겠지만, 그걸 입에 맞게 탈바꿈시키는 재주가 엄마에게는 없었다. 싼 물엿으로 조린 멸치볶음은 늘 딱딱하게 한 덩어리로 굳어 있어서 씹을 때마다 입천장을 찔렀다. 김치는 짜고 질겼고, ‘짠지’는 짰지만 물컹했다. 철 지난 자반고등어는 가시만 많고 살은 적어 성마른 젓가락질을 하다 보면 목에 가시가 자주 걸렸다. 소풍날 김밥은 진밥 때문인지 싸구려 김 때문인지 늘 터져 있었다. 특히 엄마가 잘 못 만드는 음식은 시금치나물이었다. 봄철 별미인 시금치나물은 시금치를 적당히 데치는 게 관건이다. 한소끔 끓어오를 때 불을 끄고 바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