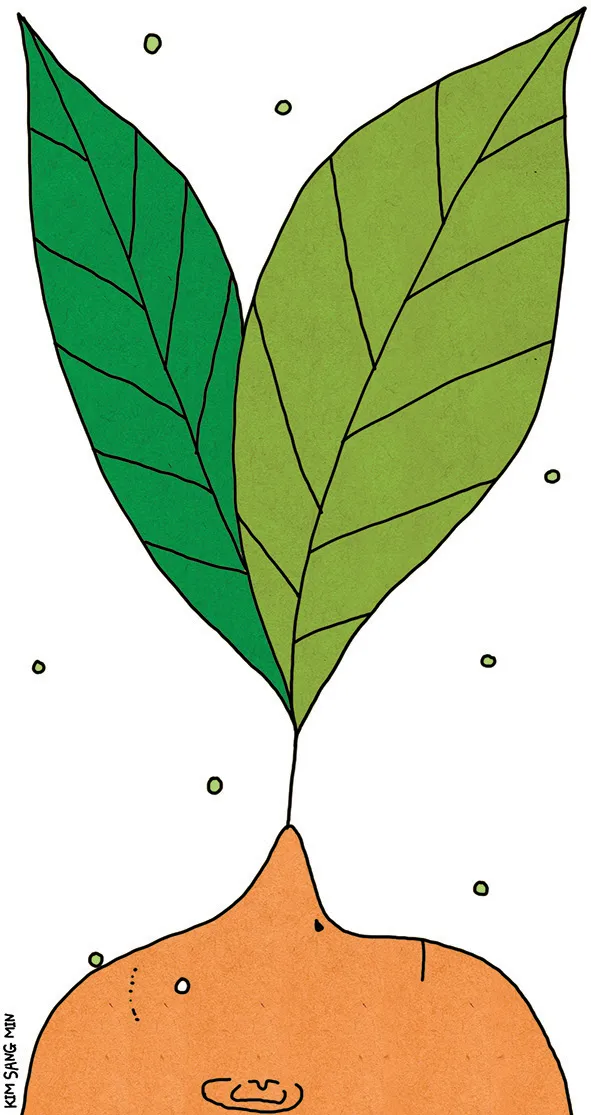
봄날, 나뭇잎 하나의 몽상
입력 : 2024.03.07 20:22 수정 : 2024.03.07. 20:26 이갑수 궁리출판 대표
봄은 오되 기차처럼 온다. 참새 떼 훑고 가는 가시덤불로도 은근히 오고 바지 주머니에도 와서
사람들 인정 넉넉하게 데운다.
봄은 잎에 업혀서도 나온다. 대개 꽃보다 먼저 피는 잎은 가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풍선 좀 보라며,
피리처럼 힘껏 불면 다투어 봄을 싣고 이 세상으로 불룩하게 나오는 것.
나뭇잎은 나무의 입에 불과한 것 같아도 그 생김새가 저마다 독특하다.
물푸레나무 잎사귀는 가장자리가 물결처럼 꿀렁꿀렁해서 어느 나라의 해변 같기도 한데 그 물가에서 자맥질하며 놀던 아이들의 파리한 입술을 닮았다. 섬마다 지천인 동백잎은 둘레마다 까끌한 톱니가 발달했는데, 손으로 한바퀴 돌리면, 어느 바깥의 모서리를 만지는 느낌이다.
어떤 운명을 점지한다는 지문과 그 물결은 절호의 궁합을 이루며 어느 결에 세상에 없던 곳으로 나를 배달해 주는 것.
연약한 잎사귀는 떡잎보다 조금 컸을 땐 짐승들의 해코지를 피할 겸 부러 못생기게도 보이고, 거치가 아주 거칠다. 짐승들의 사나운 이빨을 피해 잠깐 뾰족해지는 것이다.
그러지 못해서 안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차마 그럴 수 없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잎사귀들의 순한 마음.
높이 오를수록 두루 원만해지는 잎사귀는 궁금한 게 많아서 무슨 선반이나 창고를 얹어두기도 한다. 곤충한테 짝짓기 장소를 흔쾌히 제공하던 잎사귀를 보면서 성실을 떠올리고 그 미덕을 헤아리던 날, 하늘과 잎이 직방으로 소통하는 봄비와 맞닥뜨렸다. 공중에서 긴 발들이 내려와 잎사귀를 북 치듯 깨우고 돌아다닐 때, 문득 숲에서 올빼미처럼 거저 눈이나 껌뻑거리던 나는 이런 짧은 글로나마 그 흥분을 겨우 달래보는 것이었으니.
“가끔 나는 상상한다//
남산의 나무와 서울시민을 일대일 대응시키면 어느 집합이 더 클까/
인왕산 잎사귀들의 표면적을 몽땅 더한 것과/
서울특별시 총면적은 어느 게 더 넓을까//
잎사귀 한 장은 프랙털 구조/
그 길이를 곧게 펴면, 서울 성곽 둘레보다 길까/
-아, 그게 무슨 허튼소리야, 저기 달까지도 연결하고, 우주를 울타리 하고도 남을걸//
그럼, 이런 건 어떨까/
북한산에서 가장 큰 잎사귀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해 보는 것/
-마라톤 우승자에겐 부상으로 진달래 능선의 길쭉한 돌멩이 하나 머리에 씌워주는 건 어때?”
'칼럼읽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감의 반경 (0) | 2024.03.31 |
|---|---|
| 일주일은 왜 7일일까 (1) | 2024.03.31 |
| 파김치 (0) | 2024.03.30 |
| 세상을 담는 방법 (0) | 2024.03.29 |
| 목적과 수단이 바뀐 삶 [똑똑! 한국사회] (1) | 2024.03.28 |
